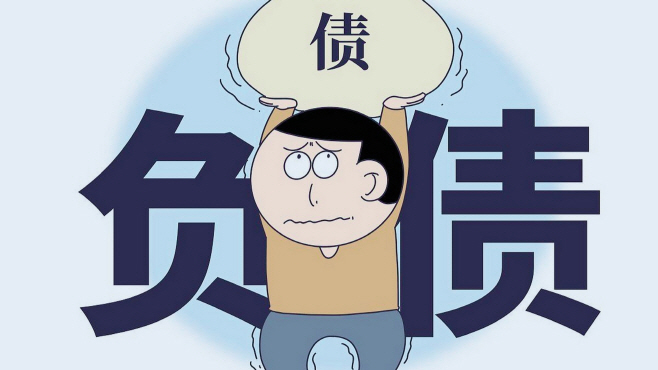월 1000 위안 버는 노동자 무려 6억
역시 공동부유가 최고 선이 돼야 희망
|
무역 흑자 역시 엄청났다. 7조1000억 위안(元·1405조 원)을 기록, 웬만한 중견 국가의 GDP(국내총생산)보다 많은 1조 달러 가까운 실적을 거뒀다. GDP의 경우는 135조 위안(18조7500억 달러)을 기록, 늦어도 2년 내에는 20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2035년까지 경제 총량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이 절대 허언증 환자의 자신감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파고들어가 현미경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중국 경제의 실상은 많이 달라진다. 미국을 위협하는 G2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점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진짜 그런지는 역시 통계가 증명한다. 먼저 정부, 기업, 가계 등의 이른바 트리플 부채가 장난이 아니다. 비관적인 관측을 하는 일부 민간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GDP의 450% 전후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가계 부채는 GDP의 150% 수준인 200조 위안에 이르고 있다. 부채를 보유한 이들도 무려 3억 명에 이른다. 채무자 1인당 빚이 평균 60만 위안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은 아주 가볍게 나온다.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빚의 70%가 주택 담보대출이라는 것과 수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지속 하락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끔찍한 재앙이 충분히 닥칠 수 있다.
청년 및 중장년 실업 상황도 심각하다. 특히 청년 실업은 당분간 해결이 어려운 골치거리로까지 대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률이 15.7%로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장년 실업의 경우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에서 35세 이상은 정년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무엇보다 잘 설명할 것 같다. 재수 없게 이 케이스에 해당돼 해고되는 이들은 재취업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거나 이전보다 훨씬 질 낮은 직장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일해야 한다.
빈부격차 상황 역시 거론해야 한다. 지니계수(빈부격차를 말해주는 지수. 1로 가까워질수록 빈부격차가 심함)가 무려 0.514 전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의 0.324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0.4보다도 훨씬 높다. 남아공이 0.618로 세계 최고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정적인 현실들을 종합할 경우 특별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극한 직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해 '고난의 행군'이나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는 눈물 겨운 표현을 들먹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2023년 10월 말에 타계한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생전에 "중국에는 월 1000 위안을 버는 근로자가 무려 6억 명이나 된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던 것은 진짜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중국의 당정 최고 지도부도 이 기막힌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공동부유를 국정의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이후 경제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공동부유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먼저 부자가 되라는 이론)을 대체하는 확실한 국정 운영 기조가 됐다. 기업보다는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들이 속속 출현하기도 했다. 무작정 성장보다는 부의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스탠스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될 기미를 보이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민영 빅테크들을 독려하면서 선부론이 유일 선(善)이던 이전으로 경제 운용이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이 지난 17일 주요 빅테크의 수장들을 불러모은 심포지엄(좌담회)을 개최한 것을 보면 확실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 항간에는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라는 말이 있다. 또 "병원 가는 것은 어렵고 병원비는 비싸다"라는 유행어도 여전히 전 대륙에서 배회하고 있다. 최소한 인구의 절반 이상인 경제적 약자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선부론을 중시하는 경제 운용으로 회귀하면 결과는 뻔하다. 무한경쟁의 정글 속에서 소리조차 못 내고 죽어가는 경제적 약자들이 부지기수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G1이라는 목표는 진짜 무망해질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중국이 돌아봐야 할 국정의 최고 선은 역시 공동부유가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