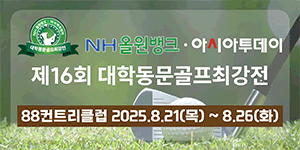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서 파는 작업을 넘어서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공장이나 플랜트를, 의견이 맞는 이들을 매칭시켜 사업을 벌이는 소위 '오거나이징'까지 척척입니다. 그 유연한 비즈니스 마인드, 지금 우리 제조 기업에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올해는 국내 종합상사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합상사 지정제도란 1970년대 다변화하는 수출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시장 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역상사의 자본 및 거래 규모를 대형화하려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이 수출 국가로 발돋움하고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데 상사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조사들이 해외와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월등히 상승했지만, 종합상사는 50년이 되도록 한 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실업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보면 상사가 한국 경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합상사'라는 표현 대신 '종합사업회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핵심 산업의 밸류체인을 통합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식량, 이차전지소재 등 그룹 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자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하면서 LNG 탐사·생산부터 수송, 저장, 발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 한 결단도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입지를 다진 셈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지난해 연결 매출이 32조원 이상이고, 영업이익도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철강과 이차전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그룹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에너지, 식량, 소재 등 3대 핵심사업에서 창출됐습니다.
상사는 과거의 상품 중개 역할을 넘어 핵심 산업의 밸류체인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상품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도전하는 게 상사의 역할이기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업태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도 보다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쉬운 변화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업무대로 수출 중개에만 매달렸다면 지금 상사회사들은 아마 극소수가 명맥만 유지하는 식으로 존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사의 업태 변화를 주목할 이유는 현재 경제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군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철강과 석유화학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수출 산업의 대표적인 품목일 뿐 아니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이어서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중후장대의 경직성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종합사업회사들의 묘안들에서 배워볼만한 구석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