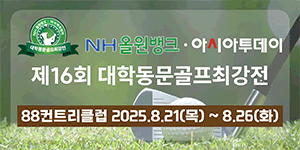보호관찰관 1명이 대상자 19.5명 감시
관리 부실 속 범죄 재발 가능성 커져
전문가 "제도 개선으로 보완책 마련"
|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연이어 활동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4000명 수준이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대상자는 연평균 4000명대 수준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2020년 4052명 △2021년 4316명 △2022년 4421명 △2023년 4188명 △2024년 4474명 등 최근 5년간 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전자감독 대상자 중 성폭력 사범 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2621명으로 약 63%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 1명 당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5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5년간 1인당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0년 19.1명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 △2023년 18.2명 등으로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20명에 육박한다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법무부의 보호관찰활동을 포함한 범죄예방활동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예산 4조4641억원의 4%(1716억원) 수준에 그쳐 당장 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니 전자발찌 훼손 범죄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55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부터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강화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등 성능이 향상된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및 관리 인력 탓에 훼손 범죄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심도 있는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보통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이들이 피해자에게 보복심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인력 확충보다 특정 조건에 따라 활동 제한 명령을 어기면 조건부 수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앞 접근 또는 음란물 시청 금지 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다시 수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거짓말 탐지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관이 직접 우범자를 감독하고 동향을 파악해 특별한 경우 일정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는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